그렇다면 한강의 결빙과 해빙 기준은 뭘까?
공식적인 한강 결빙은 1906년부터 노량진 앞(현재 제1한강교(한강대교) 남단에서 둘째와 넷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을 기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이 지점에 얼음이 생겨 물 속을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강 결빙을 판단한다.
지난 1906년 한강 결빙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강이 가장 빨리 얼었던 해는 1934년 12월4일이며 가장 늦었던 때는 1964년 2월13일이었다.
한강 결빙일수는 지난 40년대 연평균 69일을 기록한 뒤 50년대 43일, 60년대 35일, 70년대 32일, 80년대 21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연평균 8일을 기록한 90년대는 10년 단위로는 처음으로 10일 이하로 떨어졌다.
해빙이란 광의의 뜻으로는 바다에 떠 있는 모든 얼음을 말하지만, 보통 육지에 기원을 갖는 빙하빙이나 빙산 등과 구별하여 형상에 관계없이 해수가 동결하여 생성된 얼음을 말한다.
위에서 말했듯 결빙이란 얼음으로 인하여 수면이 완전히 덮여서 수면을 볼수없는 상태(얼음의두께와는상관없음)를 말한다면, 해빙이란 결빙 되었던 수면이 어느 일부분이라도 녹아서 노출되어 재결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수는 보통-1.7~-2.0℃에서 결빙한다. 해면상을 움직이는 해수를 유수라 하고, 움직이지 않는 해수를 정착수라 한다. 해빙은 얼음의 표면에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해빙은 모양과 상태에 따라 해안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여 멀리까지 확대되어 얇고 평탄하게 된 얼음으로, 두께가 2.5m 이하의 것을 야빙(野氷)이라 하며, 야빙이 바람에 의해 깨어져 해상에 떠도는 것을 부빙(浮氷)이라 한다.
군빙(群氷)은 부빙이 바람에 의하여 한 장소에 쌓인 것이다. 해빙이 해류를 타고 흘러오는 것은 소위 유빙(流氷)이라 한다. 해빙면적은 북극해 및 그 주변에 900만㎢(여름)~1,800만㎢(겨울) 남극해에서는 500만㎢(여름)~2,000㎢로 변한다. 남극빙상면적이 약 1,500만㎢이므로, 해빙의 냉열원으로서의 역할은 크다. 해빙역과 개수면과의 경계는 빙연(ice édge)이라 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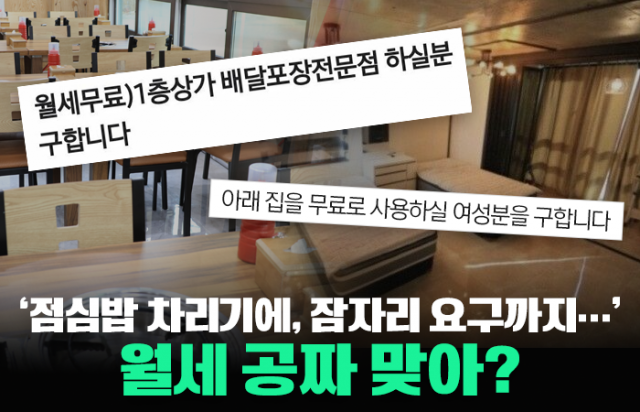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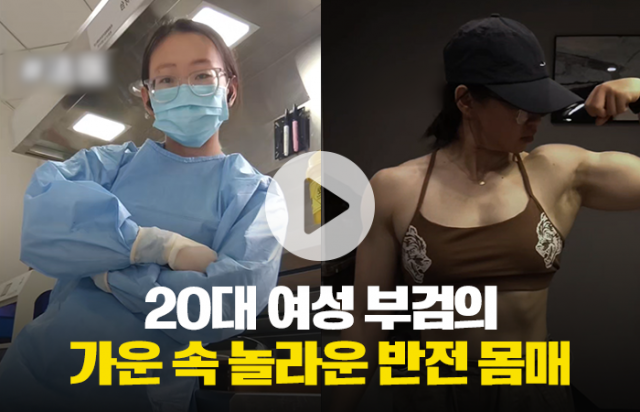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