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극도의 절제를 넘어 영화 제목처럼 ‘무례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강요한다. 보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하지 말고 공감도 하지 말며 심지어 먼지 한 올 수준의 동정도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영화 속 배경에 등장하는 빛과 담벼락을 이루고 있는 벽돌 한 장, 찢어져 바람에 날릴 듯 한 낡은 벽보 한 장도 대사로 변주돼 다가온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지 않은 거리를 다가서고 때론 멀어지고를 반복한다.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감정에 동요될 때 쯤 다가선 거리를 멈춘 채 동요된 감정의 희석을 기다린다. 때론 이들의 복잡한 가슴 속 깊은 내면이 드러나 이해할 수 없는 파도에 휩쓸릴 때쯤이면 멀찌감치 달아난다. 절제라는 단어보단 흡사 방관과 방치의 수준으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을 뒤따를 뿐이다.
영화의 시작은 한 남자의 뒷모습부터다.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는 지, 아니 빛조차 들어가길 거부한 듯 한 차가운 콘크리트 배경 속에서 쓸쓸한 어깨의 한 남자가 걸어간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카메라 무빙은 점차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인물의 내면을 들춰내듯 불안한 느낌이다. 아니 위태롭다.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지지만 그렇다. 이 남자 재곤(김남길)은 살인 사건 현장으로 가는 형사다. 표정이 없는 뒷모습의 그는 결핍과 불편이 가득하다. 그를 바라보는 관객은 불안하다. 그리고 곧이어 혜경(전도연)과 살인범이자 그의 애인 준길(박성웅)의 질펀한 섹스신이 등장한다. 질펀하고 끈적한 느낌의 육체적 교합은 없다. 단지 생존을 위한 번식이 아닌 삶의 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행동이다. 혜경은 불안하다. 준길이 자신을 버릴 것만 같다. 준길은 대답 대신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으로 혜경을 끌어안을 뿐이다. 혜경은 그 순간에도 확인받고 싶다. 그리고 믿고 싶다. 자신이 믿는 그것을 믿고 싶다.
그런 혜경을 바라보는 재곤은 혼란스럽다. 그는 무자비한 형사다. 자신의 목적으로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동료 형사 문기범(곽도원)이 승합차에서 떠벌리는 재곤에 대한 낯뜨거운 취조 에피소드는 흘려듣기에는 모호한 맥락이 있다. 재곤은 태생적으로 여성에 대한 감정 자체를 지우고 사는 인물이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휴대전화 속 아내(?)와의 대화 속애서도 아주 조금 느낄 수 있다. 그의 삶은 무미하고 건조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 영화 내내 제대로 된 잠을 자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정체된 삶이 아니다. 그는 혼란스럽다. 아니 피곤하다. 처음 시작과 함께 등장한 재곤의 뒷모습, 그리고 그의 어깨를 누르는 알 수 없는 무게는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관객들에게 다가온다. 재곤은 머물고 싶어한다.
그런 재곤에게 혜경은 어쩌면 무미하고 건조한 삶, 피곤하고 지쳐가는 무채색 일상에 활력이란 색깔로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전직 텐프로 에이스에서 지금은 변두리 작부로 전락한 혜경은 지워져가는 듯한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 더욱 강렬한 색으로 자신을 휘감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하고 위태롭다. 혜경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분명한 것투성이다. 애인 준길은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기묘한 관계만 이어간다. 그런 불안 속에 언더커버(잠입경찰)로 자신에게 다가온 영준(재곤)은 자신의 불안을 감지하고 자꾸만 다가온다. 준길에 대한 믿음과 영준에 대한 관심이 충돌한다. 혜경은 불안하다. 어서 빨리 누구인들 자신을 이 늪 속에서 꺼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재곤도 혜경이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갈수록 자신도 휩쓸리고 마는 탁한 감정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었음을 알게 된다.
혜경은 버릇처럼 중길에게도 재곤에게도 또 재곤의 또 다른 얼굴인 영준에게도 묻는다. “진심이냐”고. ‘무뢰한’의 세상에선 진심도 그리고 진실도 또 그 두 가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도 없다. 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진 논바닥의 틈새사이로 이 모든 것들은 스며들었고 사라져 버린 뒤다. 그저 먼지가 날리듯 퍼석거리는 흙바닥 위에 성냥불 하나만 가져다 대면 순식간에 타버릴 숨 막히는 현실만 남아 있다. 재곤의 뒷모습으로 시작한 영화는 마지막 일그러진 재곤의 얼굴로 끝을 맺는다. 그의 잔혹한 말 한 마디가 표면적으론 날이 시퍼런 비수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118분의 ‘무뢰한’을 견뎌 낸 관객들에겐 그 어떤 고백의 수사보다도 안타깝고 눈물 섞인 비가로 전해져 올 것이다.
2000년 ‘킬리만자로’ 이후 15년 만에 내놓은 ‘무뢰한’을 내놓은 오승욱 감독은 “종잇장보다도 얇은 인간관계의 이면을 그려내 보고 싶었다”고 연출의 변을 전한다. 눈물 한 방울로도 구멍이 뚫리고 흩날리는 불씨 하나로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종잇장 관계의 정립은 두 배우의 얼굴이 도구가 돼 스크린에 되살아난다. 전도연은 얼굴의 근육 하나, 눈가의 주름 하나만으로도 혜경의 삶과 불안한 정서를 살려내고 그려냈다. 전도연은 ‘무뢰한’을 통해 여배우가 해낼 수 있는, 아니 배우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끝을 움켜쥐고 관객들에게 그 손을 펴보여 준다. 물론 전도연의 한 편에 선 김남길의 또 다른 불안이 마지막 시퍼런 날이 돼 그 손에 움켜 쥔 무언가를 두 동강 내는 마지막 대사 한 마디는 ‘무뢰한’이 그리는 하드보일드 멜로에 마침표를 찍는 한 수가 된다.
하드보일드란 껍질 속에 멜로란 알맹이를 담고 있는 ‘무뢰한’의 끝 맛은 무미하고 건조한 또 다른 하드보일드일 뿐이다. 오승욱 감독의 다음 작품이 무조건 기다려진다. 전도연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다. 김남길의 마지막이 비수처럼 다가온다. 개봉은 오는 27일. 청소년관람불가.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cine5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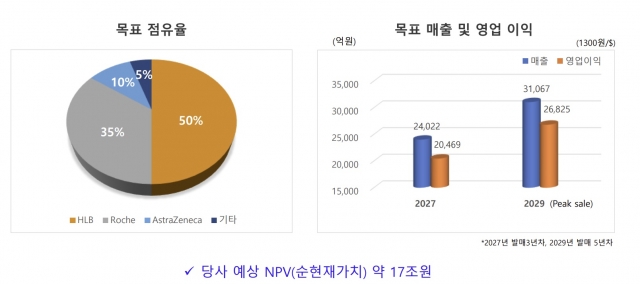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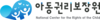











댓글